
태화강 십리대숲. 대나무가 푸르다.

바람이 불면 대숲은 일렁인다. 바람결 하나까지 다 품고 함께 일렁인다. 태화강 반짝이는 물결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깃들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걱정 말라’고 대숲에서 이는 바람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희망은 언제나 당신 옆에 있다’며 물결마다 햇빛이 반짝인다.

태화루에서 십리대숲까지 걷다
태화강 십리대숲은 태화강대공원 안에 있다. 태화강과 작은 개울과 습지, 대숲이 있는 태화강대공원으로 가는 길 첫머리를 태화루로 정한다. 태화루는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호다.
옛날에 울산을 찾은 나라의 관리나 외국 사신이 머물던 공간이 학성관이었는데, 태화루는 학성관의 남쪽 문루였다.
일제강점기인 1940년 울산공립보통학교(현재 울산초등학교)를 넓히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 지었다. 2003년에 화재로 전소된 것을 2007년에 복원했다.
태화루에서 십리대숲까지 약 1.5km를 걷는다. 태화루에서 태화강 둔치로 내려서서 왼쪽을 보면 태화강 절벽 위에 지어진 태화루가 보인다. 그 아래 물길 이름이 용금소다. 옛날에는 용연이라고 불렀다.
신라시대 자장법사가 중국 태화지에서 만난 용의 복을 빌고 신라의 번창을 기원한 곳이 용금소라고 한다. 용금소 아래 동굴이 있는데 함월산 자락에 있는 백양사의 우물과 연결됐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태화강 둔치길을 따라 십리대숲 방향으로 걷는다. 여름 햇볕이 뜨겁다. 그 모든 열기는 어쩔 수 없이 여행자의 몫이다. 길을 걸으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멀리 보이는 산 능선부터 강물 위를 나는 큰 새의 깃털까지 눈길 닿는 곳에 마음을 얹으니 마음에 이는 생각은 오직 그 능선, 그 새의 깃털뿐이다.
열기에 숨이 막히고 흐르는 땀이 옷을 적신다. 몸이 힘들어질수록 정신은 또렷해진다. 맑아지는 정신으로 바라보는 풍경은 선명하게 마음에 찍힌다.

대나무 숲에 앉아
십리대숲과 여행자는 그렇게 만난다. 순하게 솟은 남산에서 시작된 바람이 태화강을 건너 대숲을 지난다. 바람이 지나가면 대숲은 물결처럼 일렁인다. 대숲은 그렇게 바람의 결을 다 품는다. 대숲으로 들어간다. 대숲에 든 바람이 댓잎을 흔들며 지나간다. 풀 먹인 이불 홑청 향기다. 햇볕 향기 머금은 새 빨래의 살가운 촉감이다. 엄마의 손길이다.
대 숲에 난 길에서는 자연스럽게 걸음이 느려진다. 멈추어진다. 대숲에 놓인 긴 의자에 앉는다. 하늘을 가린 대나무 잎새를 통과하는 햇볕이 파스텔톤으로 빛난다. 햇살이 초록빛 가루가 되어 내려앉는 것 같다. 여행자도 그렇게 물든다.
물드는 건 편안해진 몸뿐만 아니다. 걸음을 멈춘 여행자의 마음에서 상념이 자란다. 대나무순처럼 자라나 대숲보다 더 높이 자라는 생각을 그대로 놓아둔다. 생각은 그렇게 자란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걷는다. 대숲을 나와서 강가에 선다. 물결마다 반짝이는 건 햇빛이다. 울주군 백운산 탑골샘에서 발원해 울산만을 만나 바다가 되는 48km 태화강 물길, 그 물길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태화강은 흐른다.

태화강가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태화강을 말없이 바라본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마음이 있다. 여름 해도 기울면 부드러워진다. 길어지는 그림자를 보며 돌아가야 하는 길을 생각한다. 대숲 위로 새들이 난다. 강물을 건너 산으로 돌아간다. 숲은 그렇게 생명을 품는다. 강 건너 남산이 여행자 앞으로 성큼 다가오는 느낌이다.
강을 두고 돌아간다. 발길이 닿은 곳은 강가에서 보았던 남산이다. 가파른 오르막길이지만 구간이 짧아 어렵지 않게 올라간다.
강에서 보았던 정자에 섰다. 풍경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곳에서 조금 전에 앉아 있던 강가의 자리와 대숲을 본다. 조금 전에 현재의 자리였던 곳이 이제는 풍경이 된다. 지나간 풍경이다. 풍경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이 그곳에 있었으므로 지나간 풍경이 되는 것이다. 지나간 풍경은 자라나는 생각과 함께 어우러져 추억이 된다.


해파랑길 33코스, 추암해변에서 묵호역까지 이어지는 13.3km의 길을 걷는다. 기암괴석의 해변 추암에서 묵호역까지 걷는 동안 기찻길 옆 소소한 생활의 풍경이 여행자와 함께한다. 묵호역에 닿기 전, 하평해변과 기찻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자유다.

추암, 바다에서 타오르는 불꽃 바위들
추암해변은 작다. 미역 줄기가 파도에 밀리고 쓸리는 바다에서 아이들이 자맥질을 한다. 여름 바다의 주인공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노는 해변 앞에 바위섬이 떠 있다. 바닷물이 닿는 바위섬 밑동에 작은 동굴이 보인다. 들고나는 바닷물에 깎이고 파인 것이다. 바위섬은 뿌리 없이 물결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해변으로 둥그렇게 들어온 바다 한쪽 옆에 작은 숲이 있다. 숲이라고는 하지만 넉넉한 품이 아니라 해변 바위 절벽에 나무들이 자라난 곳이다. 그 앞에 촛대바위가 있다. 한때는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고 끝날 때 촛대바위 앞으로 솟아나는 일출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유명해진 추암해변의 촛대바위는 옛 명성을 지금도 잇는다. 관광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촛대바위를 사진에 담느라 분주하다. 그곳에는 촛대바위만 있는 게 아니다. 바닷가 절벽의 날카로운 바위와 기암괴석들은 바다에서 피어오르는 불꽃 같다.
절벽과 바위 군락을 뒤로하고 나오는 길 오른쪽에 작은 기와집이 보인다. 1361년(고려 공민왕 10년)에 삼척 심씨의 시조인 심동로가 지은 해암정이다. 조선시대 우암 송시열이 함경도로 귀양 갈 때 이곳에 들러 글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기찻길 옆에서 영그는 땀방울
추암해변에서 도로로 나가는 관문은 굴다리다. 기찻길 아래 뚫린 굴다리로 차와 사람이 드나든다. 굴다리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걷는다. 거대한 굴뚝이 하늘로 솟았다. 해파랑길 이정표는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안으로 여행자를 안내한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통과해서 문을 나오자마자 우회전한다.
여행지 같지 않은 풍경이다. 공장 시설물 때문에 어수선한 길은 숲으로 들어간다. 길지 않는 숲길에서 마고암(할미바위)의 이야기가 남아 있는 곳을 지난다. 숲을 나오면 동해시를 지나온 전천이 바다를 만나는 물길 앞에 도착한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간다. 북평5일장이 서는 곳을 지나 길은 전천 둔치로 내려간다. 작은 물길 옆 나무 그늘 아래 의자가 놓였다. 여름날 오후가 한가롭게 쉬고 있다.

낮은 다리를 건너서 동해역으로 가라는 이정표를 따라 접어든 길에 기찻길 옆 생활의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기찻길 옆에서 옥수수가 자란다. 긴 옷에 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부부가 기찻길 옆 밭에서 김을 맨다. 나이 든 아저씨가 등에 멘 통의 손잡이를 잡고 펌프질을 하며 밭에 무엇인가를 뿌린다. 열기와 습기를 머금은 끈적한 공기에 연신 땀이 흐르는데 저들은 밭에서 흙과 엉기며 땀을 흘린다. 밭 한쪽에 서 있는 허수아비만 한가롭다.
크지 않은 논에 빼곡한 벼 포기들은 기차 바퀴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논과 기찻길 사이로 난 진흙길은 추억의 골방에 남아 있는 서정의 뿌리에 닿는다. 생활의 편린이 고스란히 드러난 풍경은 그렇게 여행자를 추억으로 들어가는 길로 인도한다. 추억을 따라 걷는 동안 동해역을 지나고, 길은 기찻길을 따라 나란히 이어지는 솔숲으로 이어진다.

사라져가는 이름, 묵호
해군부대 앞을 지나 굴다리를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솔숲길을 만난다. 오른쪽은 기찻길이고 왼쪽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다. 가끔 지나가는 기차가 낭만적이다. 기차는 언제나 그렇다.
하평해변이 보이는 팔각정에 오른다. 전망 좋은 곳이다. 원호를 그리며 해변으로 들어온 바다의 곡선을 따라 기찻길도 굽어진다. 바다와 기찻길이 만드는 풍경 앞에서 서정이 인다. 이곳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자유다.
전망 좋은 곳에서 내려서서 기찻길 건널목을 건넌다. 열차가 오려는지 땡땡거리며 종이 울리고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간다. 곧이어 삼척과 정동진을 오가는 바다열차가 달려온다. 불빛을 밝히며 달려오는 기차를 바다가 따라온다. 멀어지는 기차의 뒤를 보며 걸음을 다시 뗀다. 묵호항역 앞을 지나 묵호역으로 가는 길은 시간이 멈춘 거리다. 세월이 가면서 잊히는 기억처럼 사라져가는 이름, 묵호. 이제는 역 이름에나 남아 있는 묵호가 이 골목에 살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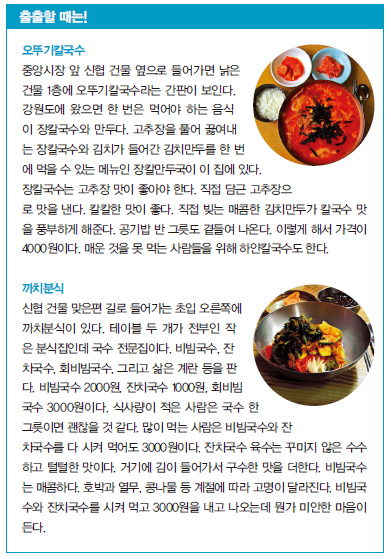
글·사진 장태동 여행작가
